- 볼티모어 4 : 8 종료 보스턴
- 첼시 1 : 0 종료 토트넘
- 요미우리 0 : 0 경기전 한신

돌아온 장현식 가장 반긴 김강률

7라운드 김천 한번 믿어봐? OOO이 전북에 강하다고?|볼만찬XK리그판타지
-
 1
승부
24
700,845명
1
승부
24
700,845명
-
 2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0
539,927명
2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0
539,927명
-
 3
미키 17
2
2,959,419명
3
미키 17
2
2,959,419명
-
4 플로우 1 109,830명
-
 5
백설공주
2
172,791명
5
백설공주
2
172,791명

10초만에 알 수 있는 정관장 돌풍! 김경원 블록. 피스톨 액션. 박지훈 스쿱샷

"진짜 안맞아 안맞아" 방망이 짧게 잡은 90억 캡틴, 타격감 찾기 위해 절치부심 구슬땀

타자들 집합시킨 외인 투수 폰세, 극강의 친화력.ZIP
- 볼티모어 4 : 8 종료 보스턴

















![[공식]](https://sports.chosun.com/news/html/2025/04/04/2025040401000315200039111.jpg)






![정체성 잃은 '홈즈', '나혼산'인줄…집 찾기 어디가고 퇴사한 '김대호 팔이'[SC이슈]](https://sports.chosun.com/news/html/2025/04/04/20250404010003163000393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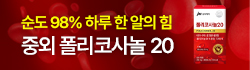







![[이슈] 故 설리 두번 죽인 친오빠, 김수현 '리얼' 저격 계속 “속단하지마”](https://sports.chosun.com/news/screennews/403_20250404_2025040401000315300039121.jpg )

![[이슈] 뉴진스 “민희진 없어 어도어 못가” 주장, 재판부 어리둥절 “신뢰관계 파탄 잘못 알았나”](https://sports.chosun.com/news/screennews/403_20250404_2025040301000248600029421.jpg )

![[이슈] 정체성 잃은 '홈즈', '나혼산'인줄…집 찾기 어디가고 퇴사한 '김대호 팔이'](https://sports.chosun.com/news/screennews/403_20250404_2025040401000316300039371.jpg )





![[팩트체크]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https://sports.chosun.com/news/screennews/401_20250404_202504040000000000003858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