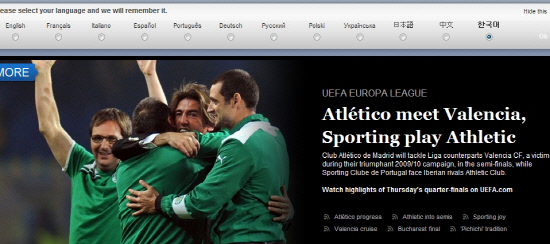|
'스페인 전성시대'가 클럽 무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프리메라리가의 중계권 구조 때문이다. 사무국이 중계권료를 모두 취합해 차등 분배하는 EPL과 달리, 프리메라리가는 각 팀들이 직접 중계권료를 협상할 수 있다. 스타선수들이 많은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한 반면, 나머지 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적은 금액에도 만족해야 했다. 프리메라리가에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가속화됐다.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대항마로 꼽혔던 발렌시아조차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양강의 독주로 '제2의 스코틀랜드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셀틱과 레인저스가 수년간 1,2위를 독식하며 타 팀들은 경쟁력을 잃었다.
그러나 스페인 팀들의 유로파리그 4강 독식으로 프리메라리가 중위권 팀들의 경쟁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유로파리그는 리그의 중상위권팀들이 참가한다. 리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잣대다. 1990~1991시즌 베오그라드 레드스타, 1992~1993시즌 우승을 차지한 마르세유 등에서 보듯 유럽챔피언스리그는 리그의 수준에 상관없이 특출난 한, 두팀의 힘으로 우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로파리그는 중소규모의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수준이 고만고만하다. 전력차가 크지 않아 경기력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유로파리그의 경우 맨유, 맨시티, 토트넘 등 전력에서 앞서는 EPL팀들이 베스트 전력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프리메라리가의 힘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결과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