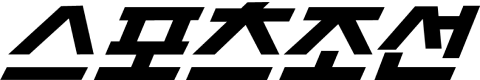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박주영(셀타 비고)의 우즈베키스탄전 보직은 '특급조커'다. 이동국(전북)-박주영 투톱은 이번에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로 밸런스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한국의 주 포메이션은 4-2-3-1이다. 남아공월드컵부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톱을 중심으로 한 4-2-3-1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 포메이션에서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횡이 아닌 종으로 놓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박주영이 미드필더로도 활약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전문 포워드다. 4-2-3-1 전술에서 3의 중앙은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의 몫이다. 과거 프랑스에서 지네딘 지단, 현재 독일에선 메주트 외질이라는 특급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위치에 섰다. 공수를 오가는 미드필더 대신 포워드가 위치한다면 밸런스가 깨질 수 밖에 없다. 데니스 베르캄프 처럼 이타적인 공격수도 있지만,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골에 대한 본능이 있다. 후방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능적으로 전방을 향해 뛰어나간다. 이 과정에서 밸런스가 무너진다. 4-2-3-1 포메이션의 탄생 배경은 공수밸런스 유지다. 공격수 숫자를 늘려 수비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팀 전체가 흔들린다. 그렇다고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 공격수에게 수비 가담을 강요한다면 스트라이커를 두 명 둔 의미가 없어진다.
스타일의 변화도 한 몫을 했다. 이동국과 박주영 모두 스타일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동국은 연계플레이에 눈을 떴다.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패스를 주고 받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난시즌에는 도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박주영도 2선에서 볼을 잡아 플레이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 전방에서 몸싸움을 즐기며, 공중볼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 타입으로 변화했다. 전방에 있어야 할 이동국은 내려오고, 뒤에 있어야 할 박주영이 올라오니 그 과정에서 두 선수간 동선이 겹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훈련을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두 선수는 충분히 호흡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