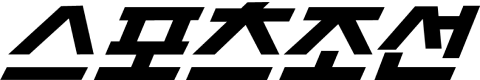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
중국의 게임 성장세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책에 기인한다.
중국 역시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이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관심을 돌렸고 대표적으로 게임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전역에 IT 특구가 마련돼 있는데, 차이나조이가 열린 상하이에만 3곳이 있다.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고, 해외 석박사 인력을 유치하면 연봉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또 세계 혜택은 물론 일정 매출 이상을 벌면 정부에서 인센티브까지 준다. 산업 장려에 대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게임을 진흥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코트라의 조사에서 규제가 계속될 경우 차라리 해외로 나가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한국 게임사들이 80%에 이르러 충격을 준 바 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국 게임을 주로 퍼블리싱하고, 그래픽과 같은 노동집약 작업을 하청받던 중국 게임사들은 풍부한 자금과 유저층을 기반으로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 현장에서 만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석원 과장은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부분의 한국 게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자국 게임 수준이 성장하면서 중국 게임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많아졌다"며 "모바일게임의 경우 굳이 구매하지 않고 손쉽게 베끼는 경우도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모두 하이엔드급에선 여전히 한국 게임사들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등 세계적 IT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회사들이 국내 게임사에 적극 투자, IP를 확보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와이디온라인 이재용 해외퍼블리싱사업본부장은 "중국은 한국보다 장르 편중 현상이 적고,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모바일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또 아직까지 한국 게임의 비교우위가 있다. 좋은 퀄리티의 게임이면서도 중국 유저의 입맛에 맞는 현지화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