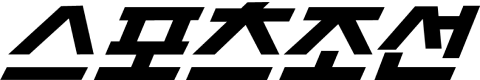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
'야구 불모지' 중국이 KBO리그의 활로가 될 수 있을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축구굴기'를 선언한 뒤 축구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번에는 야구 차례인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나.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이 많다. 대략 지도자가 600명, 심판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인력이 많다. 임경완 이혜천 같은 선수가 호주리그에 진출했는데, 이런 선수 정도라면 중국에서 충분히 뛸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지도자 요청이 있었다. 얼마전 중국 야구 관계자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방문하기도 했다.
|
―KBO가 먼저 중국에 협력을 제의했나.
우리가 먼저 접근한 건 아니고, 프로야구 출범이 과제가 된 중국측이 먼저 다가왔다. KBO리그도 외연 확대가 필요했다.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다. KBO는 2020년까지 관중 1000만명, 10구단 체제 출범, 자생력 확보 등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구단은 창단은 이미 이뤄졌다. 관중 1000만명 시대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국내 시장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한국, 일본, 대만에만 야구가 활성화 돼 있는데, 야구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다음 차례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다.
―중국이 야구 선진국 메이저리그, 일본보다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나.
메이저리그는 너무 멀고, 직접 오기가 쉽지 않다. 또 중일 관계는 역사 문제가 얽혀 안 좋다. 중국과 일본야구기구(NPB)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 중국은 고등학교 팀 50~60개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야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한다. 한국이 벤치마킹을 위한 모델이다. 현재 중국에는 고교팀이 50여개 정도 있다.(KBO는 오는 8월 부산 기장군에서 열리는 KBO 유소년 야구캠프에 중국 유소년 야구 2개 팀과 지도자들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야구 활성화가 한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류와 함께 KBO리그가 주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야구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치맥'을 즐기면서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중국 시장을 두드려봐야 한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