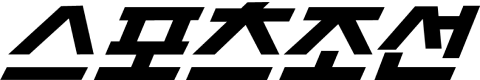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한 소집기간 34개월 동안 해당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즉 올림픽 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혜택이 주어지니 매번 대표팀을 구성할 때마다 KBO 기술위원회와 해당 감독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발탁하겠다고 해놓고도 실상 병역 미필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팀별 안배도 고려 사항이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사실 쿠바,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야구 강국들이 총출동하는 올림픽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메달 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다르다. 일본은 사회인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리고, 대만은 한국만큼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절실하지 않다. 한국으로선 병역 미필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해도 최강 전력이다. 한국은 프로 선수들이 참가한 5번의 아시안게임 가운데 4차례 금메달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기 쉬운 아시안게임 야구라는 말이 나오는게 무리도 아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금메달 획득에 따른 이후의 결과물이 병역혜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병역혜택이 보상이자 권리였다면, 그 연장선에는 의무가 존재한다. 물론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한 야구인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군면제를 받은 선수는 일정 기간 국가대표팀 차출에 응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느끼는 의무감이 필요하다.
병역혜택에 따른 의무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고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의 그라운드다. 자신의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 한다. 해외진출, FA 등 개인의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팬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그것이 국가를 대표한 공로로 혜택을 받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