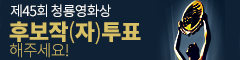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저는 부상에 지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만큼 버텼거든요."
돌아온 클래식, 결국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5번이나 칼은 댄 무릎이 더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수술을 해도 회복 확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미련없이 유니폼을 벗기로 했다. 윤원일은 "2015년 초부터 무릎이 더 안좋아졌다. 회복을 기대하고 재활을 했지만 악화됐다. 조금만 훈련을 해도 물이 찼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좋은 답을 주지 않았다. 수술해서 회복한다면 또 도전해보겠지만 작은 확률에 기대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7시즌 중 그가 나선 경기는 단 65경기. 기대 보다는 아쉬운 프로생활이었다. 윤원일은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죽을만큼 버텼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다했기에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들 그라운드에서만 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활 과정이 훨씬 혹독하다. 밖에 안나가고 연속으로 1년 6개월 동안 재활훈련에만 전념한 적이 있다. 그때 3주 운동한다고 하면 첫주는 즐겁고 2주째는 지겹고 3주째는 미친다. 3일 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해보라.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인지 마음적으로는 일찌감치 은퇴에 대한 준비가 된 것 같다. '시원섭섭'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너무 프로답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원일은 "너무 촌놈 같이 했다.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프로다웠으면 부상도 덜 왔을지 모른다"고 했다. 부모님도 아쉬움 대신 격려로 윤원일의 은퇴를 축하해줬다. 윤원일은 "부모님이 누구보다 고생했다는 것을 아시니까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하시더라. '이제 몸은 안아프겠네'라며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윤원일은 이제 지도자로 새 출발한다. 울산대 코치로 부임한다. 윤원일은 실패했던 선수생활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조금 다른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윤원일은 "선배님들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 다른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가졌지만 결국 기존 감독들과 다르지 않은 지도자가 되더라. 장담은 못하겠지만 조금 더 다른 지도자가 되고 싶다"며 "좋은 축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언젠가 K리그 클래식 감독이 되는 날도 올지 모른다"며 웃었다. 윤원일의 축구 2막을 응원해본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