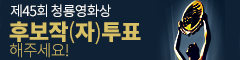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1. 지난 여름 런던올림픽 현장에서 박태환은 경기 종료 후 조기귀국을 열망했다. 메달리스트들은 폐막식 때까지 남아있어야한다는 지침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실격번복 파문속에 금메달의 꿈도 세계기록의 꿈도 이루지 못했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긴장이 풀린 탓에 감기몸살까지 겹쳤다. 런던만 바라보고 4년간 물살만 갈라온 박태환은 집이 그리웠다.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곱게 보였을 리 없다. 엄격한 윗사람의 잣대로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체육 현실에서 선수가 협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메달리스트의 가치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금'을 두고 자식같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어쩐지 옹졸했다.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수영연맹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박태환의 런던올림픽 포상금 미지급건이 불거졌다.정기자체감사 결과 보고에서 은메달 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수영연맹은 베이징올림픽 이후 올림픽 메달을 따면 금 1억원, 은 5000만원, 동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단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을 때만 100%가 지급된다. 입상만 할 경우 50%가 지급된다.
사실 박태환을 위한 공약이었다. 올림픽 포상금 대상자는 예나 지금이다 박태환이 유일하다.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작 지급됐어야 포상금 5000만원이 올림픽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 연맹 이사회는 지난 11월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박태환 측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다.
소위 '괘씸죄'다. 연맹은 수영 간판스타이자 유일한 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은 "포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런던부터 쌓여온 감정이 마스터스대회에서 폭발했다. 결국 포상금 미지급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1일 "포상금은 줘도 되도 안줘도 되는 것이다. 연맹이사회에서 포상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이사회가 포상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포상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회장이 사재를 털어 선수들을 치하하는 '특별격려금'이다. 하지만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은메달 2개를 딴 박태환의 포상금을 의심한 이는 없었다. '수영영웅' 박태환은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 몇 안되는 선수다.
포상금은 이사회 결의 여부를 떠나 당초 대한수영연맹이 먼저 내건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졌어야 했다. 2008년 이후 연맹 포상금이 실제 박태환에게 들어간 적도 없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1억원,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포상금 5000만원, 2011년 상하이선수권 포상금 5000만원은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경기력 향상 발전기금,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됐다. 포상금은 포상금이다. 좋은 의도로 마련된 포상금이 '징계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 박태환 측은 "포상금은 중요하지 않다. 포상금을 받더라도 후배들에게 기부할 것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 써야 옳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선수의 품격'을 거론하며, 흠집내고 상처주는 것이 화가 나고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비단 수영연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올림픽 영웅들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휘둘렸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모른 채 끌려나온 경우도 허다했다. 현장에선 오죽하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메달 딴 게 후회된다"는 얘기까지 들렸다. 국민 앞에서는 영웅이지만, 협회 앞에서는 찍힐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작은 존재다. 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기단체는 선수들에게 "이 행사에 와줄 수 있겠냐?"라고 의견을 묻지 않는다. "이 행사에 와!"라고 강요한다. 선수 본인의 의사는 중요치 않다. 'NO'라고 말하는 순간 눈 밖에 날 각오를 해야 한다. 편안하게 운동하기 위해선 '예스맨'이 돼야 한다. 각 경기단체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수의 인권은 경기장 바깥에서, 한가족 같은 협회 안에서 더 철저히 존중받아야 한다.
은메달 이후 박태환의 인기는 오히려 폭등했다. 수영 불모지에서 전무후무한 금메달 기적을 일군 이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롤러코스터 같은 시련 속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따낸 박태환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금메달 이상이었다.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을 선언한 박태환은 현재 호주 브리즈번에서 나홀로 물살을 가르고 있다. 선수의 상처를 다독이고 사기를 진작해야 할 수영연맹만이 유독 자기자식을 흠집내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수영은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수영연맹에서 오라는 행사에 가지 않아 찍혔다?' 이런 상황이 '박태환 경쟁자' 마이클 펠프스, 파울 비더만, 야닉 아넬에게도 있었을까.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