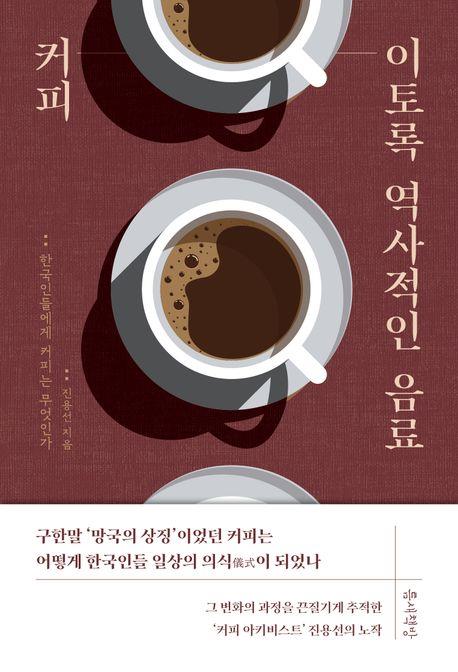|
|
|
|
|
|
|
최근 출간된 '커피 이토록 역사적인 음료'(틈새책방)는 커피 공화국 주민이 된 한국인이 커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역사를 추적한 책이다.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인의 일상에 파고든 140년 커피의 사회사를 담았다.
책에 따르면 커피가 들어온 건 고종 때로 추정된다. 1884년 문관 민건호는 자신의 일기 '해은일록'에서 커피를 '갑비차'라고 표기했고, 같은 해 한성순보에선 커피를 '가비'로 썼다. 서민들은 맛과 색깔이 탕약과 비슷하다 해서 '양탕(洋湯)국'이라고 했다고 한다.
고종은 커피를 즐겨 마시다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궁중요리가 김종화는 간신에 매수돼 1898년 고종과 황태자(후일 순종)가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다. 평소 커피를 즐긴 고종은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한 모금만 마셔 화를 면했으나 황태자는 벌컥 들이키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황태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치아 대부분이 빠져 틀니를 끼고 사는 후유증에 시달렸다. 장안에선 '황태자가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독립신문이 이를 '커피차'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백성들은 커피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일제강점기 때 커피는 모던 보이들의 상징이 됐다. 1927년 조선인이 개업한 최초의 다방 '카카듀'를 시작으로 '메기시코', '낙랑파라' 등이 잇달아 개업했다. 문인들과 영화인들은 다방에 모여 예술과 엄혹한 시국 문제를 논의했다. 일부는 희망 없는 미래를 한탄하기도 했다. 낙랑파라의 단골이었던 소설가 박태원은 소설 '구보씨의 일일'에서 당대 다방의 분위기를 이처럼 묘사한다.
"다방의 오후 2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이 피로한 것 같이 느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살림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다. 동서식품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들은 1970년대 내놓은 커피믹스로 이른바 '대박'을 쳤다. 다방에서만 즐기던 커피믹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과 사무실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1980년대에는 국내에서 커피 전문점이 등장했고, 1990년대 들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 나오더니 1999년 마침내 스타벅스가 국내에 상륙했다. 스타벅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에도 지속해서 성장해 2000년대 커피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됐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즐기는 커피는 처음 들어왔던 그 시절의 커피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한국인이 즐기는 커피는 K-컬처처럼 다양한 맥락이 복합적으로, 그러면서도 조화롭게 섞인 그 무언가라고 부연한다.
388쪽.
buff2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