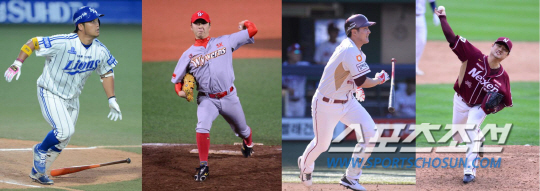|
이적의 계절이다. 떠나 보내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 유니폼을 만들고, 라커룸을 손질하고, 전력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2016시즌은 착착 다가온다.
이번 FA협상 과정에서 더 한 일도 있었다. FA선수인 B는 지난 시즌 막판 친분이 있던 C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몸상태가 아주 좋으니, 나를 꼭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감독은 구단에 이 선수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C감독은 FA계약 마지막날까지 구단 관계자들과 B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잠시 뒤 다른 팀과 전격적으로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혀를 찼다. 염치가 없어 미안하다는 전화를 하지 못했겠지만 속이 상할 수 밖에 없었다. 엄연히 탬퍼링 조항 위반이지만 이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다.
FA협상 도중 미자격 에이전트들이 의견조율을 하기도 했다. 정작 구단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웬만한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몸값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이전트를 통해 어렴풋이 희망조건을 전하고 '간'을 본다. 이후 선수는 직접 몸값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둘러댈 수 있다. 구단제시액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벌떡 일어선 뒤 뒤늦게 "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몸값이 치솟다보니 선수와 구단의 전략도 다양해지고 설명하기 복잡한 일이 물밑에선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구단의 나쁜 행태에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수년간 선수난으로 선수쪽으로 협상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상대적 약자(?)에게서 더많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하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