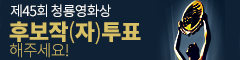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12월이다.
그러나 '시도민이 주인'인 시도민구단은 과거에 머물렀다. 시도민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구단 운영의 위임을 받았다. 전문성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다. 하지만 누구를 앉히든 강력한 감사 기능도 작동해야 한다. 잘됐든, 잘못됐든 첫 번째 공과는 단체장에게 있다. 몇몇 수장은 자신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는다.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출 행동과 경남FC 구단주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해체 발언은 한국 프로축구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결국 K-리그는 무늬만 프로였다. 반쪽자리였다. 정치인들의 입김에 만신창이가 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기업구단도, 시도민구단도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의 K-리그라면 미래는 없다.
상품, 사람, 철학이 없는 '3무(無)의 K-리그'로는 외부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 과연 탈출구는 없을까.
매력적인 상품은 축구다
그라운드는 땀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다. 상품은 역시 축구다. 매력적인 상품이라면 팬들이 몰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시즌 개막전 모든 사령탑들이 "공격적인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공약한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면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수비 축구가 득세한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다. 90분을 지켜보기가 따분하다. 물론 잠그면 뚫어야 한다. 그러나 K-리그에는 메시도, 호날두도 없다.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곧 동계전지훈련 캠프가 시작된다. 거창한 말은 필요없다. 성적보다 어떻게 재미있는 축구를 구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팬들은 승패를 떠나는 감동이 물결치는 축구장을 바란다. 그래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주체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는 4000만 축구 전문가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말처럼 축구는 쉽지 않다. 그랬더라면 K-리그가 이처럼 위기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축구는 선수들이 하지만 구단 운영은 다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경영, 기획, 선수단 운영 지원, 마케팅, 재무, 홍보 등 기업 운영과 매한가지다. 하지만 시도민구단이 낙후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방 권력 교체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지 못했다. 연속성도 사라졌다.
축구 행정가를 꿈꾸는 미래의 주역들이 꽤 있다. 각 대학에도 다양한 스포츠산업 학과가 개설돼 있다. 기성세대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지구촌 축구와 함께 호흡할 수 없다. 축구인 출신이 축구 행정을 호령하는 시대도 끝났다. 축구인과 비축구인이 융화돼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사람이다.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축구 행정가의 세대교체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그라운드 사고의 폭도 넓어진다.
철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축구단은 봉사 단체가 아니다. 기업구단은 모기업에만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 시도민구단은 자치 단체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수익창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축구의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눈높이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매년 단 한팀만 정규리그 우승을 누릴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호흡이 긴 정규리그의 경우 정상에 근접한 팀은 3~4구단밖에 되지 않는다. 시즌 개막전 각 구단은 현실에 맞게 팬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꼴찌도 아름다운 세상, K-리그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그림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