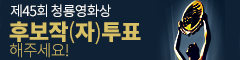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바람 잘 날 없다.
불과 닷새 전인 13일 인천 유나이티드가 서포터스의 경기장 난입을 막지 못해 7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또 사단이 벌어졌다. 공교롭게 인천이 원정길에 올랐다. 신임 김용갑 감독이 데뷔전을 치른 강원의 홈경기였다. 오심 여부를 떠나 또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적'에게는 페널티킥을 줬고, '아군'에게는 페널티킥을 안 줬다는 것에서 충돌이 시작됐다. 강원은 후반 20분 김동기의 선제골로 리드하다 15분 뒤 디오고에게 페널티킥골로 동점을 허용했다. 그리고 후반 43분 인천 남준재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1대2로 역전패 당했다. 강원 팬들은 디오고에게 페널티킥을 준 반면 이후 웨슬리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비슷하게 넘어졌는 데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판정된 부분에서 분노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결국 경기 후 폭발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관중석에서 10여명의 팬들이 그라운드 트랙으로 난입했다. 심판들은 보안 요원의 보호로 심판실로 이동,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다. 그리고 200여명이 팬들이 출입구를 막으면서 심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사이 심판들은 다른 출구를 이용, 경기장을 빠져 나갔다.
'시위'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임은주 강원 사장이 진화에 나선 후 일단락됐다. 임 사장은 팬들과 만나 "비디오 분석을 해서 프로축구연맹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팬들은 "결과를 공지해 달라. 공지가 안되면 다음 홈경기 때 어떻게 할 지 모른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 프로연맹은 19일 강원-인천전을 분석했다. 그러나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천 팬들은 3일 울산전(2대2 무) 후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2-1로 앞선 후반 16분에 터진 울산 하피냐의 동점골 장면에서 김신욱의 '핸드볼 파울'을 지적하지 않은 주심의 판정에 뿔이 났다. 인천 팬들도 주심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포터스의 대표 3~4명은 주심을 직접 만나겠다며 믹스트존 앞까지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흥분한 팬들과 보안 요원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심판진이 경기장을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인천 팬들은 3개의 출입구를 지켜섰다. 주심을 비롯한 심판진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심판실에서 나가지 못했다.
심판도 인간이기에 오심을 할 수 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물론 팬들로선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심판 면담 요구는 승산없는 싸움이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 실력 행사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응원하는 구단만 징계를 받을 뿐이다.
서포터스는 K-리그의 한 축이다. 그러나 권력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압력에 끌려다니는 구단도 몇몇있다.
선진 응원 문화를 만드는 것도 서포터스의 몫이다. 일반 팬들이 서포터스를 향해 박수를 보낼 때 그 문화는 꽃을 피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선은 지켜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