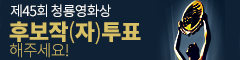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2월 26일 첫 발걸음은 화려했다.
서울은 30일 안방에서 경남과 3월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2대2로 비겼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경기 후 "우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씁쓸해 했다. 클래식 4경기 중 3경기를 홈에서 치렀다. 그래서 아픔이 더 크다.
리그 초반 불어닥친 디펜딩챔피언 서울의 위기, 과연 어디에서부터 꼬인 것일까. 최 감독은 대행 꼬리표를 뗀 첫 해인 지난해 K-리그를 평정했다. 2년차인 그는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비에서 시작된 위기
서울이 지난해 K-리그를 제패한 원동력은 완벽에 가까운 공수밸런스였다. '데몰리션' 데얀과 몰리나가 빛이 났지만 수비라인의 보이지 않는 헌신은 최강의 무기였다. 서울은 지난해 그룹A에서 최소 실점(42실점)을 자랑했다. 모든 전문가들도 인정한 부분이다. 최 감독도 11월 21일 제주전(1대0 승)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가장 먼저 품에 안은 선수가 골키퍼 김용대였다. 공을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이 달라졌다. 수비라인에서 위기가 시작됐다. 클래식 4경기에서 8실점이다. 포항전 2실점, 인천전 3실점, 부산전 1실점, 경남전 2실점, 무실점 경기가 없다. 김용대는 인천전에 이어 경남전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의 키를 넘겨 골망을 흔든 보산치치의 두 번째 골은 34세의 베테랑 골키퍼가 내줘서는 안되는 골이었다. 명백한 판단 착오였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태유, 오른쪽 윙백 고요한, 중앙수비수 김진규도 지난해의 헌신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 뒷문이 부실하다보니 골을 터트려도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다.
절박함이 없다
서울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우승후보지만 최고 먹잇감이다. 상대는 패해도 본전이다. 비기면 절반의 성공, 승리하면 대어를 낚게 된다. 동기부여는 또 있다.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밑질 것이 없다. 집중력이 배가된다. 거칠게 몰아치며서 이변을 노린다.
서울의 고충이지만 품격이 다른 팀이 되기 위해선 현실을 넘어야 한다. 상대를 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의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선수들의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듯 하다. 그라운드에 리더가 없다. 주장 하대성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남전은 또 다른 거울이었다. 2-2 동점인 상황에서 인저리타임이 무려 6분간 주어졌다. 골을 넣기 위해선 어떤식으로든 볼이 페널티에어리어 내로 연결돼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쁜 축구'를 위해 미드필드에서 볼을 돌렸다. 절박함이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난해 서울의 객관적인 전력은 3위였다. 우승 샴페인을 터트렸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즌을 치르면 어느 팀이든 위기는 온다. 서울은 현재 위기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우승의 환희는 이제 잊어야 한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더 단단한 팀이 될 수 있다.
4월 살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클래식과 ACL 등 매주 2경기씩을 치러야 한다. 6일 울산, 14일 수원 등 호적수도 상대해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선수단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잿밥'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