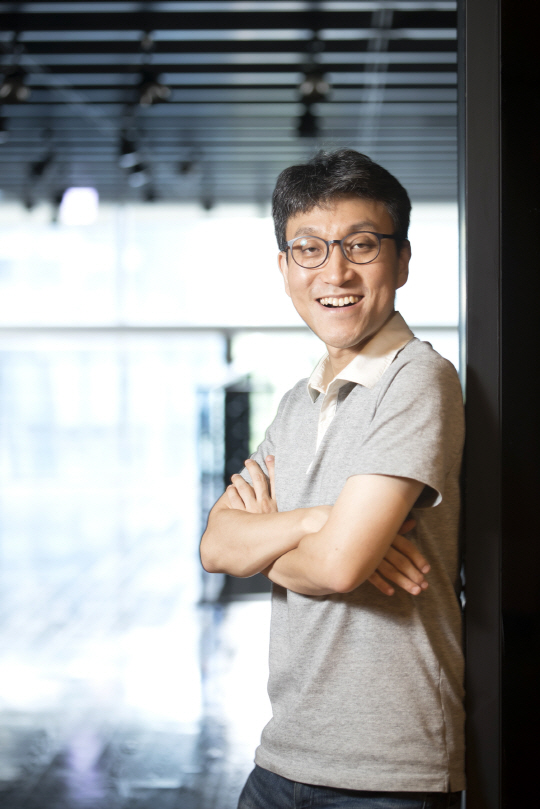|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가족 예능의 인기 얼마나 갈까?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육아 예능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수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미운우리새끼'가 현존하는 예능 최고 시청률을 과시하며 가족 예능 열풍에 화력을 더했다. '내 딸의 남자들', '싱글 와이프'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가족 예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시 가족 예능이다. 다른 것을 보여줘야한다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믈론 그런 생각도 했다. '가족 예능, 했는데 또?'라는 생각을 나라고 안 했을까. 근데 이적 후 첫 프로그램인만큼 성공 가능성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전작이 '아빠! 어디가?'였기에 연출 당시 느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마음 속에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마침 '슈퍼맨이 돌아왔다', '엄마가 뭐길래', '유자식 상팔자' 등을 만든 김성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도 가족 예능에 대한 소요가 있음을 체감했다. 작가와 나 또한 자녀가 있고, 아이들이 부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참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잘 담아내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고 예감했다.
-'둥지탈출'에서 아이들이 성냥을 쓸 줄 모른다는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성냥 뿐 만이 아니다. 정전이 잘 되는데 랜턴 사용도 생소해 하더라. 세탁기가 없으니까 빨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더라. 그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는 아닌거 같다. 우리 아들도 비슷하다. 집과 학교만 오가고 부모들이 다 챙겨주니까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다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달라지나?
아이들이 처음엔 자신의 의견을 잘 내지 않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 번 해보는거지'라는 태도를 보여준다.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변화가 있더라. '오즈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는 두뇌(지성)을, 강철나무꾼은 심장(마음)을, 사자는 용기를 얻고 싶어하지 않나. 아이들도 그렇게 점점 자신에게 없던 것을 하나씩 채워나간다. 유성이는 한국어가 늘고, 유리는 적극적으로 바뀌고. 현실주의 원석이와 이상주의 대명이는 미묘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조금씩 배워가더라.
-가족 예능 열풍 계속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공감이 크고, 다른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물론 비슷한 방식이면 질릴 수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ran61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