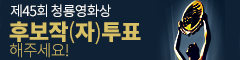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13년 전, 하얀 교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던, 깨끗하고 뽀얀 피부를 자랑하던 '만인의 여동생'. 큰 눈망울에서 옥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 전국의 오빠들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국민 여동생' 문근영(28)이 어느덧 서른을 코앞에 둔 여인, 여배우가 됐다.
이후 문근영의 행보는 180도 달라졌다. 본격적인 인생 2막을 연 그는 2009년에만 KBS2 '신데렐라 언니' 연극 '클로져' KBS2 '매리는 외박 중' 등 무려 세 작품을 섭렵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2012년 SBS '청담동 앨리스', 2013년 MBC '불의 여신 정이'까지 쉼 없이 달렸고 마침내 올해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이하 '마을', 도현정 극본, 이용석 연출)로 방점을 찍었다.
소녀가 여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처럼 작품을 고르는 문근영의 눈 또한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특히 주·조연의 경계가 없는 '마을'을 단번에 선택한 그의 단호함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증명한 계기가 됐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작품을 선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엔 많은 부분을 의식하고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에 대한 기대치 때문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해'라는 압박감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영화 '사도'(15, 이준익 감독)가 아니었나 싶네요. '사도' 출연을 결심할 때 '내가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의존해야 하는 거지?'라고 느꼈거든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죠. 다행히 이런 제 변화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셨어요. 단순히 '국민 여동생'으로 탈피가 아닌 방향성을 바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지를 바꾼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
"예전에는 '국민 여동생'이란 타이틀이 부담이었죠. 때론 싫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지키고 싶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행운인 것 같아요. '국민 여동생'으로 완전히 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국민 여동생'이 생겨나는 걸 보고 느낀 점이에요(웃음). 아쉽지 않느냐고요? '여동생'은 아쉽지 않은데 '국민'은 아쉬워요. 앞으로 '국민 여배우' '국민 누나' '국민 이모' 등 '국민'이 붙을 수 있는 배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배우 인생 중 전성기, 암흑기를 모두 겪었다고 자신한 문근영. 제대로 된, 성숙한 면모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욕심이 뜨거워진 것. 흥행 캐릭터, 흥행 작품이 아닌 좀 더 좋은 캐릭터, 좋은 작품으로 필모그래피를 채워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성인이 된 '국민 여동생'은 달라도 달랐다.
"뭐든 하고 싶고 뭐든 만들고 싶어요. 이전에는 '이 역을 해도 될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든 좋으니 진짜 좋은 연기,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만 해요. 주로 주인공 캐릭터 제안이 많았는데 간혹 시놉시스를 읽으면 서브 캐릭터가 더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브 캐릭터를 하고 싶다고 말해도 '농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절 안 해도 된다'며 치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드는 역할이 있으면 계속 부딪혀 보려고요. 악착같이 달려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시도할수록 기회가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욕심이 가장 많이 샘솟는 지금 그걸 시험해 보고 싶어요."
깨지고 부서지면서 헛헛하게 보냈던 문근영의 20대. 그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20대의 마지막을 가장 완벽히,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다가올 서른 살, 누구보다 찬란한 시작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국민 여동생'이 아닌 '국민 여배우'로 도약을 예고하면서 말이다.
|
soulhn1220@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