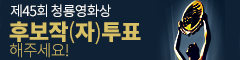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솔직히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T파울 경고를 날릴 생각을 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있던 관중들도, 기자석에서 보던 기자들도, TV를 시청하던 농구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데 심판은 그렇지 않았나 보다. 단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감독의 몸부림으로 보였나 보다. 트레블링이 아니냐는 감독의 제스처가 심판의 눈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항거로 보였나 보다.
갑자기 이상한 체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T파울 경고를 날렸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계속 날렸다면, 양팀 감독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 시점에서 이미 경고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T파울이 완성됐다. 자유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승부처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상황이었다.
또 한 명의 심판이 말리려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국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이 넘어갔다. 1점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판정은 완벽한 굳히기였다. '심판의 경기를 지배한다'는 비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챔프전 경기를 하는 SK도, DB도 패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불신을 받던 프로농구 심판진들이 영원히 농구 팬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1점'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벼운 항의가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였을까. 그래서 T 파울 경고를 날렸고, 챔프 4차전을 승기를 굳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됐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얼마나 심판의 '권위주의'가 프로농구의 '독소'가 됐는 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본이었다.
왜 이런 심판의 권위주의가 프로농구에 기생하게 됐을까. 김영기 총재의 정책을 살펴보자.
그는 심판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현재, 심판의 연봉은 완벽히 '성과급' 위주다. 기본적으로 받는 봉급은 100만원 대 초반이다. 그리고 주심으로 나설 때 80만원(추정치), 부심으로 나설 때는 50만원(추정치)을 받는다.(KBL에서는 심판의 봉급을 알려줄 수 없다고 취재 결과 통보했다. 간접 취재한 결과 김영기 총재 이후 심판진의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본봉을 100만원 초반으로 줄이고, 성과급 위주로 주심과 부심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런 정책을 마련했을까. KBL의 표면적 이유는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인해 심판진의 판정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의 책정이라는 명분. 하지만, 실제로는 김 총재에 입맛에 맞는 심판진의 기용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정상적으로 주,부심으로 들어가면 나름 괜찮은 월봉을 받게 된다.
2~3년 전이다. 기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농구 팬이라면 알만한 전직 베테랑 심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심판이 너무 힘들어한다. 홈 팀이 이기지 않으면, 총재님이 불러서 '리그 흥행은 어떻게 책임질꺼냐'라고 야단을 친다'는 얘기를 했다. 이후, 그 베테랑 심판에게 후속 취재를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대로 나뒀다.
그리고 KBL은 홈 승률을 NBA와 비교해 매우 높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여전히 총재가 일선 심판을 향해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직접적 얘기를 했는 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심판진의 성과급 제도다. 총재가 심판진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베테랑 심판을 대거 잘랐고, 신예 심판들이 들어왔다. 이후, 총재는 징계를 내릴 때 '코트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코트에서 이상한 '선비주의'가 깊게 뿌리내리는 순간이었다.여기에 FIBA 룰로 바꾸면서, 감독들이 항의할 수 있는 원천을 차단했다. 즉, 심판이 감독과 선수 위에 서는 '심판 권위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를 치를수록 '심판 권위주의'는 심화됐다. 감독이 아닌 주장을 통해 항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정당한 항의도 테크니컬 파울이나 엄중한 벌금으로 대체됐다. 추일승 감독, 유도훈 감독이 피해자가 됐다.
하지만 심판의 자질은 나날이 하락했다. 챔프전에 단골로 들어오는 윤호영 김도명 심판은 '객원 심판' 신분이다. 15명의 정식 심판이 있지만, 능력있는 심판은 너무나 부족하다. 결국 4차전에 '사고'가 나왔다. 김 총재가 심판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다.
농구의 매력은 폭발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젊은이의 감성을 동반하고 있다. 심판은 자칫 오버할 수 있는 감성에 대해 때로는 보듬어주고, 때로는 정확한 논리와 잣대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KBL 심판은 어떤가. 권위주의와 이상한 배타주의가 뒤섞여 있다. 농구 팬의 감성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1점이 중요한, 그래서 시리즈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테크니컬 파울을 준다. 결국 이 판정으로 인해 시리즈 전체의 판정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리즈 흐름 자체도 엉켜버렸다.
이 사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미 늦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PS) 4차전 판정 쓰나미가 휩쓸고 간 뒤 참담했다. CBS 노컷뉴스 박세운 기자는 "SK도 DB도 모두 피해자로 심판이 한 순간에 만들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손대범 점프볼 편집장은 기자와 생각이 똑같았다. 전화통화에서 "선수들 플러핑을 비판하고, 기술부족을 비판한 부분이 덧없다. 판정 하나로 끝나는데"라고 괴로워 했다. 현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취재하는 후배 기자들이라 너무 안타까웠다.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플라핑, 판정분석 기사를 쓰면 뭐하나. '자괴감'이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