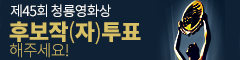남자 프로농구 사상 첫 챔프전 3연패의 금자탑. 모비스가 해냈다. NBA에서도 단 세 팀(보스턴 셀틱스, 시카고 불스, LA 레이커스)만 달성한 기록이다. KBL 출범 18년 만에 모비스가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
|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때로 객관적인 전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치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투지가 만들어낸 성과다. 김 코치는 백업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상대의 빈틈을 파고 들었다. '만수' 유재학 감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동안 김 코치도 어느새 노련한 승부사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라틀리프는 팀의 확고한 중심으로 우뚝 섰다. 송창용과 전준범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대표팀에서 존스컵 우승 소식을 전해들은 유 감독은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 그냥 맡겨놨는데,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크게 기뻐했었다. 우승 자체보다 백업 선수들이 수비와 조직력에 눈을 떴다는 점을 더 높이 평가했다.
이런 성과는 유 감독이 모비스에서 11년 동안 꾸준히 '1등 DNA'를 뿌려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코치는 당시 존스컵 우승 후 "사실 내가 특별히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뭔가를 만들어 낸 게 아니다. 우리는 계속 연습해왔던 농구를 했다. 감독님이 안계시니까 그 동안 해왔던 기본을 반복하고, 강조하셨던 것을 나 또한 강조했을 뿐"이라고 했다. 단단하게 뿌리내린 모비스의 시스템이 '1등 DNA'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우승은 바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금메달이다. 유 감독이 지휘했고, 양동근이 실행했다. 냉정히 말해 이 우승의 확률이 가장 낮았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유 감독은 해냈다. 대표팀과 함께 진천훈련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자신이 지닌 '1등 DNA'를 대표팀에 심었다. 그걸 제대로 해내려고 유 감독은 사실상 모비스를 잊었다. "거기(모비스)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냉정히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던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자신이 뿌리내린 시스템과 그걸 빈틈없이 시행해 줄 김재훈 코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표팀에 온 신경을 쏟은 결과, 한국은 아시아의 정상에 다시 설 수 있었다. 이 대회의 우승은 유 감독과 양동근에게 또 다른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줬다. '안되는 게 없다'는 확신이다.
|
|
그렇게 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벤슨을 과감히 버렸다. 이기심을 앞세워 팀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선수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팀에 독이 된다고 봤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벤슨을 퇴출함으로 인해 라틀리프의 책임감이 늘어났다. 대체 선수로 영입한 아이라 클라크는 '조직기여도'측면에서 벤슨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1등 DNA'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