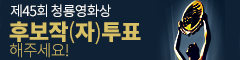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1990년대 프로농구 탄생의 기폭제가 됐던 농구대잔치의 묘미는 대학팀의 반란이었다.
당시 기라성같은 농구스타들이 포진하던 삼성, 현대, 기아 등 실업 강팀들을 대상으로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대학 강호 동생들이 선전을 펼치는 모습에서 농구팬들은 열광했다.
이같은 열기를 이어받아 1997년 탄생한 것이 한국 프로농구다.
농구대잔치의 묘미는 16년이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990년대 농구대잔치를 계승해 출범한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첫 최강전에서는 중앙대가 KGC를 잡는 파란을 일으켰다. 올해에는 대학팀의 반란이 더 거셌다.
고려대가 오리온스, KT, 모비스를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서 상무를 잡고 우승한 것을 비롯해 경희대도 반란 대열에 섰다. 경희대는 8강에서 모비스에 패했지만 16강에서 KCC를 반란의 제물로 삼았다. '약자'라고 생각했던 아마추어들이 '강자'인 프로팀을 무찌르는 장면이 최강전의 묘미인 것이다.
한데 얼핏 생각하면 명색이 프로팀이 대학팀에게 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프로 선수가 아마 선수보다 실력이 달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1회 최강전의 경우 프로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던 11∼12월에 개최됐다. 당시 프로 구단 사이에서는 프로 시즌을 치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부상 선수 발생하면 안된다', '빨리 떨어져도 좋으니 리그에 집중하자'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한 게 올해 8월에 2회 대회가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팀의 반란 사례는 훨씬 늘었다. 여기에는 작년과 다른 또다른 사정이 있었다.
프로팀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시기적인 요인이다. 이번 최강전은 프로와 대학팀이 확연하게 다른 컨디션 주기에서 만났다.
프로팀들은 10월 시작되는 리그에 맞춰 선수들의 컨디션을 만들어 낸다. 지금 이 시기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체력훈련 정도를 마쳤거나 지난 시즌 많이 뛰었던 선수들의 재활에 치중할 때다. 이제 9월 전지훈련을 앞두고 공을 잡기 시작하며 패턴을 개발하고 연습경기 정도로 감각을 익히는 단계다. 흔히 프로 스포츠에는 리그 컨디션이라는 게 있다. 장기 레이스의 리그에 맞춰 선수들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프로농구의 경우 시즌 개막때 80∼90% 정도까지 끌어올린 뒤 경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컨디션을 더 끌어올린다. 대개 2라운드 후반이나 3라운드가 되면 최상의 컨디션이 된다고 한다.
컨디션을 너무 일찍 끌어올렸다가는 리그 후반에 체력이 떨어져 부상이 발생하는 등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다. 프로는 이같은 매카니즘 때문에 이른바 '경기 컨디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반면 대학팀들은 연중 실시되는 대학리그라는 게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정규리그를 펼쳤고, 9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꾸준히 경기를 펼쳐왔기 때문에 '경기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일부 부상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리그에 맞춰 몸이 만들어진 상태와 이제 체력훈련을 마친 상태에서의 경기력은 차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프로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프로팀들의 베스트 멤버 가동에도 한계가 있다. 아직 시즌 개막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부상을 우려해서 주전급을 일부러 빼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선수가 있다면 출전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무리하게 뛰게 하지는 않는다. 한 관계자는 "시즌 중이라면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통증주사를 맞고 뛰게 한다. 하지만 최강전에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선수권에서 출전 시간이 많았던 대다수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은 체력소모가 더 심한 만큼 최강전에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로팀의 특성상 용병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인 선수 2명이 출전했던 과거보다는 크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용병과의 패턴 플레이에 적응된 프로팀으로서는 용병없이 뛰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용병이 차지하는 자리는 가장 중요한 '빅맨'이다. 이처럼 프로 선수들은 용병과 손발을 맞춰 득점을 생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보니 용병 없는 농구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농구인은 "과거 용병 2명이 뛰던 시절에는 대학 강팀과 프로 토종끼리 붙으면 게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올해에는 예상보다 프로의 경기력이 좋은 편"이라며 웃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대학팀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인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전창진 KT 감독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학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발전했다. 특히 고려대와 경희대가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