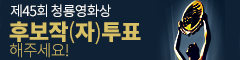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아쉽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웃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다. '꼼수'를 썼다면 3할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 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 경기 출장을 조절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승 확정 직전 경기에서 박성한은 3안타를 치면서 2할9푼9리까지 타율을 끌어올렸다. 이후 경기에서는 자신이 강한 투수를 상대로 골라 나와 안타 1~2개만 더 치면 무난하게 3할 달성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10월 5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 김광현의 시즌 마지막 등판이자 개인 타이틀 그리고 최연소, 최소경기 150승 도전이 걸려있는 경기였다. 수비를 위해서는 박성한이 꼭 필요했고, 박성한도 기꺼이 나갔다. 그는 "그날 두산의 선발 투수가 왼손 투수(브랜든 와델)였다. 코치님들이 배려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선배의 타이틀이 걸려있으니까 나가고 싶었다. 저도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4타수 무안타를 쳤다"며 웃었다. 잔인한 운명이었다.
아쉽게 첫 3할에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박성한은 여전히 올라갈 곳이 있다. 그는 "수비에서 작년에 안일했던 플레이들 다시 생각해보고, 코치님이랑 상의해서 자세도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다. 타격에서는 후반기에 들어 안좋은 습과들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페이스가 확 꺾이는걸 느꼈다. 그걸 이번 캠프에서 수정해나가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계속 살피면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강단 있는 선수' 박성한의 2023시즌이 기대된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