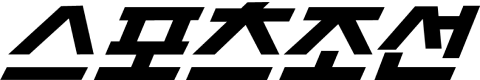김성근(73) 한화 이글스 감독에게 '야구'란 무엇일까. 일본 고치 스프링캠프에서 그간의 논란에 대해 대놓고 묻는 [the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직업이기도 하고, 동반자이자 생계수단이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김 감독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
"왜 그렇게 승부에 집착하시는가" "다 큰 프로야구 선수들을 학생처럼 막 굴려야 하나" "왜 그렇게 많이 사표를 던져왔나. 꼭 불화의 아이콘같다" 인터뷰를 기획하고 준비한 질문의 일부. 어떤 건 훨씬 독했다. '솔직'과 '무례'의 경계선을 애매하게 넘나드는 질문을 앞에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아,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예상대로 김 감독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일단 마주할 시간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는 고치 캠프에서 하루를 마치 36시간처럼 쓰고 있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식사도 가장 늦게, 선수들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혼자 한다. 질문의 내용상 진중하게 대면해야 하는데, 계속 훈련 중이라 한 두 마디 인사와 훈련 내용을 묻는 게 전부였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했다. 조금씩 땅거미가 지던 때. 나란히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했던 질문들을 꺼냈다. 김 감독은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불편해하거나 난처해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런 말들에 대해 김 감독이 그동안 조금도 신경쓰고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신념이 확고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남들의 뜬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다.
|
김 감독에게 야구란 결국 그의 70여년 생을 붙잡고 이끌어준 원동력이자 '목숨' 그 자체였다. 욕을 먹을 지언정,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할 지언정.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에서 1942년에 태어난 김 감독은 1960년 일종의 '야구특기생' 자격으로 부산 동아대에 입학했다. 한국 야구와의 인연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시에 일본 출신이라는 것과 한국어에 능통치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악의적인 역차별의 시작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는 공격받았고, 그래서 싸워야 했다.
기업은행에서 짧고 굵은 선수 생활을 마친 김 감독은 마산상고 감독(1969년)을 시작으로 본격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 아마야구 지도자를 거쳐 프로야구 팀을 맡아 약팀을 강팀으로 키워내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2번이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김 감독의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았다. 연줄에 기대 아부하지 않았고, 남의 이해를 바라지도 않았다. 어찌보면 독불장군 같은 행보. 비난과 오해의 길을 스스로 내딛은 셈이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겼다. 그 과정에서 프런트와의 충돌이 적지 않았다. 김 감독은 "조직 안에서는 '나'를 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못해. 그러면 딴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라고 말했다.
평생을 싸워왔다. 선수 시절에는 상대팀 타자를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산을 뛰어올랐고, 지도자가 되어서는 다른 팀을 누르기 위해 밤새 데이터를 파고 들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들의 손가락질, 험담, 비난과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왔다. 앞으로도 김 감독은 또 싸울 것이다. 그가 '목숨걸고' 하는 야구를 위해서라면 말이다.
고치(일본 고치현)=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