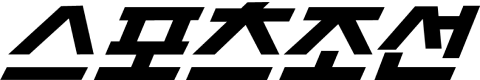사무직 근로자의 퇴직 연령이 생산직보다 빠르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이 같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사규 등으로 정한 정년연령은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모두 평균 58세로 같았다. 하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생산직 근로자는 58.7세로 조금 더 긴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오히려 3년 더 짧은 55.7세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조기 퇴직이 만연했다.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제 퇴직연령은 51.8세, 생산직도 54.3세에 불과했다. 반면, 100∼299인 중소기업의 사무직은 57.6세, 생산직은 59.8세로 나타났다. 숙련된 생산직을 구하기 힘들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정년 후 재고용 등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종도 생산직 근로자(55.8세)보다 사무직 근로자(50.6세)의 실제 퇴직연령이 빨랐다.
퇴직연령 차이가 거의 없는 업종은 철강업종이다. 철강업종 사무직 근로자의 실제 퇴직연령은 59세, 생산직은 60.5세로 조사됐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포스코 등이 철강업종에 포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창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기업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나 대응은 매우 부족
한 상황"이라며 "대응방식도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접근보다는 다분히 인건비 부담 절감이라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직보다 사무직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점도 퇴직 연령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들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임금피크제나 성과급 강화를 통한 정년 연장'(45.2%)과 '퇴직 후 계약·임시직 등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형태 다양화'(25.4%) 등이 주를 이룬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