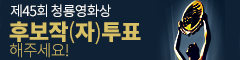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잠자던 방승환(30·부산)이 깨어나고 있다. 1년 만에 자신의 포지션을 되찾으면서부터다.
방승환은 인천(2004~2008년), 제주(2009년), 서울(2010~2011년)에서 측면 공격수나 섀도 스트라이커로 뛰었다. 부산으로 둥지를 옮긴 지난시즌, 안익수 감독의 주문으로 원톱 스트라이커로 변신했다.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맞지 않은 옷이었다. 부작용이 생겼다. 득점에 대한 강박관념에 휩싸였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축구를 그만두려는 마음도 먹었다. 방승환은 "지난해 중반 은퇴하려는 생각도 했었다. 축구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시즌 막판에는 오른발목을 다쳤다. 종아리 근육도 찢어졌다. 그러나 쉴 수 없었다. 그는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서 출전했다. 훈련을 아예 하지 못하고 휴식만 취하다 경기를 소화했다"고 했다.
적응기를 거쳤다. 교체 출전으로 윙어 역할을 소화했다. 자신의 포지션을 되찾아 선발 출전한 것은 11일 포항전이었다. 오른쪽 윙어로 나섰다. 왼쪽 윙어인 임상협과는 다른 역할이었다. 돌파보다는 원톱과의 활발한 포지션 스위치와 공수조율을 맡았다. 기존 원톱 플레이보다 훨씬 팀 기여도가 높아졌다.
방승환의 부활 뒤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있다. 가장 먼저 윤 감독의 전폭적인 믿음이다. 윤 감독은 "부산 선수들은 함께 가야 한다. 젊은 선수들이 많다보니 조직력과 좋은 분위기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또 그라운드에서 '희생'하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 몫이다. 선수들이 희생하는 만큼 나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감독과 방승환의 성격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우였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고의 궁합이었다. 훈련 도중 윤 감독이 던지는 농에 방승환은 웃음을 되찾았다. "니 인상이 가장 안좋다. 여자친구하고 싸웠나?"(윤 감독) "아닙니다. 잘 웃는데요. 헤헤."(방승환) 윤 감독은 "승환이가 많이 밝아졌다. '악동' 이미지는 과거 얘기"라고 칭찬했다.
여자친구의 믿음도 큰 힘이 됐다. 방승환은 올해 겨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6월에 하려고 했지만,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다. 방승환은 "여자친구가 힘들 때 옆에서 큰 힘이 됐다. 책임감도 강해졌다. 옆에서 잘 챙겨주는 여자친구에게 고마울 뿐"이라고 했다.
이제 맞는 옷을 입었다. 날개를 단 방승환은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는 "선수들 모두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바라고 있다. 올시즌이 적기인 것 같다. ACL에 나가면 젊은 선수들의 경험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참으로서 젊은 선수들과 기적을 이뤄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