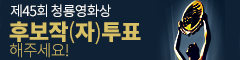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그래, 너 정도 생겼으면 인터뷰 해도 되겠다."
도끼눈을 뜨고 남궁웅(29·강원)을 바라보던 김학범 강원 감독이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남궁웅은 아직도 2011년 K-리그 개막전을 잊지 못한다. 수원 삼성에서 성남 일화로 이적한 뒤 첫 경기였다. 새로운 무대에서 도약하자고 다짐했다. 항상 발목 잡혔던 부상 문제를 털고 싶었다. 운명의 장난은 이어졌다. 전반 43분 팔이 골절되어 곧바로 교체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궁웅이 응급실에서 던진 한 마디는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였다. 잦은 부상으로 한 해에만 발목 때문에 네 번이나 수술대에 올라 전신마취 수술을 했던 트라우마에 몸서리쳤다. 죽기보다 오르기 싫었던 수술대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의 모습을 보고 '축구를 관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 놓았다. 11년간 프로무대에서 활약 했으나, 수원과 상무를 거치면서 남긴 기록은 초라했다. 성남 이적 후 첫 부상에 은퇴를 생각한 것도 어찌보면 무리가 아니었다. 남궁웅은 "수술은 잘 되어 팔은 3개월 만에 다 나았다. 하지만 마음을 못 잡고 그야말로 허송세월 했다. 형이 의지가 되긴 하지만, 같은 선수 입장이라 서로 더 말을 꺼내고 격려하기 힘든 분위기도 있었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기 마련이다. 터닝포인트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절치부심한 남궁웅은 2012년 성남의 주전 풀백으로 활약 하면서 30경기를 소화했다. 30경기를 뛴 것은 2006년 상무 시절 이후 처음이자 자신의 한 시즌 최고 기록이었다. 남궁웅은 "사실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그저 다치지 말고 한 경기, 한 시즌만 제대로 채워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작은 목표를 다 이뤘다. 원없이 뛰었다"고 회상했다. 소리내어 웃지는 못했다. 최선을 다 했으나 팀 성적은 초라했다. 남궁웅은 "모두가 열심히 뛰었고 여러가지 수를 썼지만, 한 번 침체된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진 않더라"고 아쉬워 했다.
강원 팬들은 올 시즌 새 식구가 된 남궁웅이 지난 시즌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궁웅 입장에선 열악한 재정과 스쿼드 속에 강등권 탈출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강원 생활이 생소하고 낮설기만 할 것 같다. 우문현답이었다. "이제 환경은 큰 의미가 없다. 더 안좋은 환경에서도 뛸 수 있다. 그저 내가 뛸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된다." K-리그 클래식의 호랑이인 김 감독도 남궁웅에겐 천사다. 남궁웅은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고 사실 놀랐다. 훈련과 일상의 구분이 명확하고 뒤끝없이 깔끔하신 분이다. 하지만 가슴 속에 불을 안고 계신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어느덧 프로 11년차가 된 남궁웅의 꿈은 소박하다. 그저 다치지 않고 한 시즌을 보내는 것이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정말 다른 욕심은 없을까. "5골10도움 정도?(웃음) 목표가 없다면 공격포인트를 올려도 의미가 없지 않겠나. 높은 목표라고 해도 그걸 보고 달려가고 싶다. 이제는 '남궁웅'이라는 이름 석 자가 '꼭 필요한 선수'로 기억되게 만들고 싶다."
강릉=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