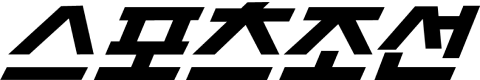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영화가 끝나고 극장 안이 환하게 밝혀진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관객은 거의 없다. 곳곳에서 낮은 흐느낌도 들려온다. 영화 '동주'와 '귀향'이 상영 중인 극장 안의 공통된 풍경이다. 다른 영화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윤동주가 은진중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웅변대회에 나갔던 일화도 짧게 소개된다. 여리고 순수한 이미지로만 기억된 윤동주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일화다. 또한 일본 유학 직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3부 필사해 연희전문 교수 이양하와 후배 정병욱에게 1부씩 증정했다는 사실도 나온다. 우리 말과 글이 금지된 엄혹한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집을 간직한 고 정병욱 교수(서울대 국문과) 덕분에 해방 이후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이 엔딩크레딧에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실제 사진,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사진도 실려 있다. 주연배우 강하늘과 박정민이 사진 속 윤동주, 송몽규와 외모까지 닮았다는 사실에 관객들은 또 한번 감탄한다. 송몽규 묘소 사진은 박정민이 옛 북간도 용정으로 답사를 가서 직접 담아온 것이고, 강하늘이 부른 배경음악 '자화상'은 연보 위로 흐르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귀향'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조정래 감독이 2002년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기획한 영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라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한 대기업 투자배급사를 대신해 시민들이 이 영화를 일으켜세웠다.
위안부로 끌려온 소녀들이 일본군에 의해 유린 당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극장 안에선 분노 섞인 탄식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탄식은 점차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바뀌어간다. 영화가 끝났어도 관객들은 눈물을 매단 채로 엔딩크레딧에 담긴 7만 5270명의 이름을 살피느라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엔딩크레딧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심리치료 중에 그린 그림도 담겼다. 영화의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 강일출 할머니의 '태워지는 처녀들'을 비롯해 김순덕 할머니의 '못 다 핀 꽃', 강덕경 할머니의 '배를 따는 일본군' 등 참혹한 경험과 아픔을 담아낸 그림들이다. 그렇게 영화는 관객들이 끝까지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든다.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