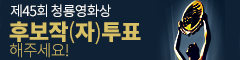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I´m Alive(나는 아직 건재하다)."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메이킹 영상, 테리 길리엄 감독이 밝힌 연출의 변이 호쾌하다. 베를리오즈가 세 번이나 무대에 올렸지만 전부 실패한 '흑역사'를 갖고 있는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거의 공연되지 않는다는 이 작품을 테리 길리엄 감독은 기어이 무대에 올리고야 말았다.
영국국립오페라가 공연한 '벤베누토 첼리니'는 영화 '피셔킹', '12몽키즈', '그림형제' 등을 선보인 영화감독 테리 길리엄의 두 번째 오페라 연출작이다. 16세기의 금세공사이자 조각가 벤베누토 첼리니의 파격적인 자서전을 바탕으로, 연인 테레사를 향한 첼리니의 격정적인 사랑, 교황으로부터 의뢰받은 페르세우스 동상 제작 과정 등이 서로 얽히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로 보는 오페라의 가장 큰 묘미는 객석에서 놓치지 쉬운 섬세한 묘사와 표현들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트의 움직임과 작은 소품의 디테일, 조명의 다채로운 색감 등 무대의 구성 요소들이 빠짐없이 한눈에 들어와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제 집 안방을 드나들 듯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환희와 절망을 표현하는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 열창하는 얼굴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클로즈업 된 화면에 담아내 진한 감동을 안긴다. 무대 아래 쪽에 위치해 객석에선 잘 볼 수 없었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혼신어린 연주 장면은 일종의 보너스다.
'벤베누토 첼리니'에서 단연 압권은 광란의 마르디 그라 카니발 장면이다. 두 연인 첼리니와 테라사가 사랑의 도주를 위해 만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두 연인에게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는 중요 장면인 만큼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첼리니의 사주를 받아 풍자극을 꾸민 극중 배우들의 위트 넘치는 가면극과 판토마임, 무용은 객석의 웃음을 자아내고, 군중의 앙상블이 빚어낸 성대한 합창곡은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테리 길리엄 감독의 창의적인 연출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명장면이다.
베를리오즈의 활달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은 지휘자 에드워드 가드너의 지휘봉이 빚어냈다. 캠브리지대학과 영국왕립음악원에서 수학하고 2007년 오페라 '베니스에서의 죽음으로 극찬을 받으며 영국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데뷔한 에드워드 가드너는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풍성한 울림을 선사한다. 극장에 오페라 아리아가 울려퍼지면 영화관 안에도 수많은 음표들이 꽉꽉 들어차며 귀를 즐겁게 한다.
오페라는 문학,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품고 있는 전방위 예술이다. 또한 역사, 신화, 종교 등의 서양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서양예술의 종합판이라고도 불린다. 지적인 향취는 물론 세속적 재미까지 갖추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치스러운 예술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벤베누토 첼리니'는 세간의 편견을 딛고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커튼콜이 진행될 땐 영화관이란 사실을 잊고 어느새 극장의 관객에 따라 박수를 보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3월 4일 롯데시네마 개봉.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