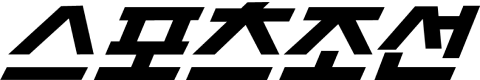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신임 야구대표팀 사령탑이 결정될 전망이다. KBO(한국야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말까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까지는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려 한다. 새 감독님이 각 구단의 스프링 캠프를 돌며 선수들의 플레이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표팀 전임감독제에 반대하는 정운찬 KBO 총재의 의중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뒤 스스로 사퇴한 '국보 선동열'의 그림자도 여전히 짙다.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과 김영덕 김성근 김인식 등 원로자문단은 최근 정운찬 총재를 만나 야구계 세대교체와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야구인 출신의 50대 기술위원장이 대표팀 시스템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가이드 라인은 있지만 그 누구도 적임자를 콕 집어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물난에 자리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내년 11월 프리미어12 예선이 새 감독의 첫 국제대회지만 새로운 코칭스태프를 꾸리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인 야구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고전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이 정점이었다. 2015년 프리미어12 초대 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거뒀지만 2013년 WBC(9위, 1라운드 탈락)와 2017년 WBC(11위, 1라운드 탈락)는 참패였다. 아시안 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제외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아시안 게임은 반쪽짜리 국제대회다. 일본은 매번 사회인야구 대표팀을 파견했다. 실질적인 경쟁자는 대만 정도다.
반면 미국과 중남미 강호들이 대거 참가하는 범대륙 국제대회에서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KBO리그의 타고투저는 대표팀내 마운드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에이스가 사라진 한국 국가대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은 상태다. 국제대회서 성적을 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운찬 총재의 '사견'은 마찰음이 컸다. 전임감독제 유지를 천명했지만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장기비전으로 준비했던 국가대표 전임감독제는 이미 생채기를 입었다. 레전드인 선동열 감독의 눈물의 퇴장 이후 팀을 맡는다는 부담감도 존재한다. 누가 됐든 가시밭길이 훤하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