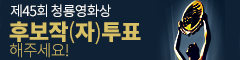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감독님께서 파이팅을 외치시는데, 선수들이 힘을 안낼라야 안낼 수 없죠."
개막 2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2015 시즌 출발을 힘차게 알린 롯데 자이언츠. 상대가 1군 막내 kt 위즈라고는 하지만, kt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롯데의 2연승 출발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온갖 내홍에 휩싸이며 어지러웠던 롯데가 올시즌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초반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 뿐. 2경기 모두 힘들긴 했지만 어찌됐든 결과가 좋았으니 반전 분위기는 확실히 조성됐다.
여기에 롯데만이 가질 수 있는 숨은 힘이 있다. 바로 이종운 감독의 넘치는 파이팅이다.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벗어 던지고 덕아웃에서 선수들과 하나가 돼 호흡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 팀 덕아웃은 매우 시끄럽다. 쉴 새 없이 동료들에게 기합을 불어넣어주고, 상대의 힘을 빠지게 하는 가벼운 야유도 나온다. 이를 현장에서는 보통 '파이팅'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고참 선수가 막내급 선수들에게 '자, 파이팅 한 번 가자' 하면 그 막내 선수는 "투수가 겁먹었다. 안타치고 점수내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그라운드로 전달하는 것이다. 공 하나하나 결과에 박수를 치고 쩌렁쩌렁 응원을 보낸다. 대게 각 팀들에는 이 파이팅을 담당하는 주요 선수들이 있다. 롯데를 예로 들면 손용석이 대표 주자다. 또, 고참 선수들보다는 후배 선수들이 목청을 돋우는 경우가 많다.
|
5대4 신승을 거둔 29일 kt전도 마찬가지. 이 감독은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잘했다"라는 격려를 큰 목소리로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유격수 문규현은 "사실 지난해 코치님으로 계실 때는 더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셨다. 지금은 감독님이 되셔서 조금 자제하시는 듯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 감독은 1군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 선수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선수들과 하나가 돼 팀 롯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되려면 감독부터 스스로 선수들과의 간격을 좁히고 소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덕아웃에 쩌렁쩌렁 울려퍼지는 이 감독의 목소리, 롯데 변신의 시발점이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