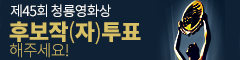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고참의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다. 선수단 분위기를 다지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나이 차이가 비교적 적은 코칭스태프와의 가교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후배를 감싸 안는 것이다.
넥센 송신영은 7년만에 포스트시즌을 경험하고 있다. 현대 시절인 2006년 플레이오프가 그의 마지막 포스트시즌 무대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현대는 해체되고, 히어로즈란 새 유니폼을 받아들게 됐다. 메인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가슴에 히어로즈만 박고 시즌을 치른 적도 있었다. 그 사이 선수를 판 돈으로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팀이 자리를 잡기 전엔 트레이드 머니를 운영비로 조달할 정도로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됐다.
송신영에겐 여전히 LG로 트레이드된 뒤 처음 등판한 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 다리가 후들 거릴 정도로 떨렸던 건 단 두 번 있었다. 2004년 한국시리즈에서 선발 피어리가 1회 조기강판돼 몸도 못 풀고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LG로 이적한 뒤 첫 등판에서 세이브를 올렸을 때였다.
모처럼 초대받은 가을잔치, 송신영 같은 베테랑도 떨림이 있을까. 그는 "사실 크게 떨리거나 하진 않다. 하지만 투수는 마운드 위에 올라가봐야 안다. 예전처럼 다리가 후들거릴 줄 어떻게 아냐"며 웃었다.
7년만의 포스트시즌 무대는 송신영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바로 현대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과 함께 선 무대기 때문이다. 트레이드와 FA 이적, 그리고 보호선수 외 특별지명을 통해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네 팀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다시 트레이드로 넥센으로 돌아왔다. 팀에 대한 고마움도 컸다.
|
송신영은 후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그는 "시즌 막판에 목동구장 외야 덕아웃에서 그라운드를 봤다. 옛날에 투수로 입단해 내 방졸로 있던 장기영이 좌익수에 있고, 택근이도 중견수에 있었다. 저 멀리엔 트레이드 상대였던 병호도 있더라. 모두들 각자 사연이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라며 "함께 고생했던 선수들, 트레이드돼 성장한 병호가 눈에 들어오자 감수성이 예민해진 것 같다. 동생들이 정말 멋있더라. 집중해서 하는 게 눈에 보였다"고 털어놨다.
지난 5월 3일 목동 KIA전도 잊을 수 없다. 다시 넥센 유니폼을 입고 올린 첫 세이브, 승리가 확정된 뒤 2년 전 트레이드 상대였던 박병호와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은 영원히 그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나이가 먹어서 괜히 감수성만 예민해졌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로선 그럴 만도 했다.
송신영은 한화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팀의 세번째 투수로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다. 사실 이날 승리했다면, 넥센은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티켓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지옥의 원정 5연전 일정이 발목을 잡았다. 지친 선수들은 상대 선발 바티스타에게 8회 1사까지 노히트노런의 수모를 겪었다.
송신영은 "내가 실점해서 졌다고 역적이 돼있더라. 하지만 상대 선발이 그렇게 던지면 승리하기 힘들다. 누군가가 실점했을텐데 그게 나여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후배들이 실점했다면, 데미지가 정말 컸을 것이다. 나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되뇌었다.
후배들을 감싸는 고참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 했다. 투수조를 이끄는 최고참으로서 든든한 모습. 창단 첫 포스트시즌에서 넥센의 '끈끈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