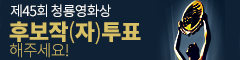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힘을 모아도 모자란 벼랑 끝이다. 그러나 손을 맞잡긴커녕 서로 떠밀고 있다.
롯데 안팎에선 이런 허 감독의 발언이 의아스럽다는 반응. 롯데 프런트는 웨이버 공시 전날 명단을 확정해 이튿날 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허 감독은 정반대의 발언을 내놓았고,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의 시기와 의도도 마찬가지. 최근 키움 히어로즈에서 자진 사퇴한 손 혁 전 감독 이슈가 이어지던 시기였지만, 허 감독을 향한 물음은 이런 정황과 비껴간 것이었다. 그런데도 허 감독이 굳이 프런트를 겨냥한 이유에 물음표가 붙었다. 롯데가 성민규 단장 체제에서 2군 육성 및 운영, 데이터 강화 등을 시도하며 올 시즌 사실상 '프런트 야구'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허 감독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롯데 현장-프런트 간의 불협화음설은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시즌 초 2군 대체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던 장원삼이 부진한 이튿날 허 감독이 "다음 임시 선발도 2군의 선택을 배려하고 존중하겠지만 결과가 또 안 좋으면 그때는 내가 선택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롯데 이석환 대표이사가 고교야구 결승전 관전을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감독-단장 간의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이사는 외부시각처럼 불협화음이 알력싸움으로 변질될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풍문처럼 떠돌던 이런 설을 내부 핵심 관계자가 외부를 통해 공식화한 꼴이 됐다. 야구계에도 오래 전부터 롯데 감독-단장 간의 불화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문제가 최근 웨이버 공시를 통해 다시 터졌다는 시각이다.
허 감독이 강경 발언을 내놓은 시점에 롯데는 희미하게나마 5강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럼에도 허 감독이 그토록 강조해온 '선수단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거론한 이유는 뭘까. 시즌 막판 동력을 얻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도 있다. 외부를 때려 내부를 결집시키고 목표로 향하는 지도법은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 스포츠 지도자들이 쓰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동안 허 감독은 선수단이 위기에 빠진 시점마다 농담을 넘어 '센 발언'을 꺼리지 않았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일면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소통법은 단기적 충격 요법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내부가 아무리 견고해도 외부에 적이 늘어난다면 궁지에 몰리는 것은 결국 본인이기 때문이다.
현장-프런트 간의 이견조율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은 10개 구단 모두가 매 시즌 겪는 일이다. 이런 집안일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알리며 화풀이를 하는 건 결국 소득 없는 감정싸움을 넘어 구단의 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원팀이 돼야 할 현장과 프런트가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신뢰의 부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프런트는 겉돌기만 했다. 외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을 뿐, 타협점을 만드는 노력은 부족했다. 현장이 프런트 의견을 무시한 채 플랜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부분에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다. 2군 개조와 육성이라는 명확한 방향성과 꾸준함은 인정받을 만하지만, 그 결실인 현장에서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과로 평가받는 프로의 세계에서 '절대 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의 책임을 현장만 지는 게 아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타협점을 만들지 못한 프런트 역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허 감독은 "내년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롯데 프런트의 시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깨진다. 작금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롯데가 그동안 파열음을 낼 때마다 어떤 길을 걸었는지 떠올려봐야 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