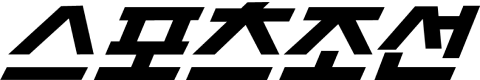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정유년의 해가 뜨겁게 떠올랐다.
늘 그랬듯 새해의 부푼 희망과 꿈은 한국 축구에도 넘실거리고 있다. 그라운드는 올 해도 숨막히게 돌아간다. 연례적인 시즌은 기본이다. 특별한 선물도 있다. 지구촌 미래 별들의 잔치인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등 24개국이 참가한다. 그 현장에는 젊음이 있다.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주, 수원, 인천, 대전, 천안, 제주를 돌며 신선한 젊음의 숨결로 구장을 채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은 1954년 스위스 대회였다. 하지만 이후 월드컵은 먼 나라 얘기였다. 두 번째 기회가 오기까지 무려 3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986년 멕시코 대회였다.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월드컵은 늘 우리의 안방을 들썩이게 했다. 적어도 30대까지는 한국이 빠진 월드컵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만큼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한국 축구의 소중한 발자취였다.
그러나 그 안에 함정도 있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랐던 것일까. 지구촌의 대축제인 월드컵 출전이 마치 당연한 듯 마취상태였다. '평시'에 열리는 A매치의 열기는 예전만 못하다. 수년째 평균 7000명선에 머물고 있는 K리그 클래식 평균 관중은 한국 축구의 현주소다. 월드컵에만 열광하는 '반쪽 축구팬'들이 수두룩하다는 진단은 몇 십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월드컵 출전을 떼논 당상으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라는 점이다.
2017년은 또 한 번의 갈림길이다. 9회 연속 월드컵 진출 여부가 올 해 가려진다. 성공하면 여느 때처럼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한국 축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확률은 여전히 반반이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청신호가 켜진 적은 없다. 빨간불과 노란불을 오가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최종예선에서 조 1, 2위는 월드컵 직행, 3위는 플레이오프(PO)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슈틸리케호는 현재 A조 2위에 포진해 있다. 살얼음판이다. 1위 이란(승점 11·3승2무), 2위 한국(승점 10·3승1무1패),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9·3승2패)이 승점 1점차로 줄을 서 있다. 3위는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B조 3위와 PO를 거친 후 북중미 팀과의 대륙별 PO까지 치러야 한다.
절반을 더 가야하는 최종예선은 3월 재개된다. 일정상 지난해보다 더 험난하다. 원정에서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자칫 한 발짝이라도 삐걱거리기라도 하면 30년간 쌓아 온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물론 대한축구협회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한국 축구는 현재 과도기다. 외부의 거대한 자본과 실리, 명분의 틈새에서 중심축부터 흔들리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럽파는 흔들리기 시작한 지 꽤 오래다. 선수는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가치를 인정받는다. 뛰지 않는 선수는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손흥민(토트넘) 등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는 날이 더 많다. 경기력 유지에는 치명적이다. 슈틸리케 감독이 '소속팀 출전=대표팀 발탁'이라는 원칙을 깨며 중용하는 탓에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선수들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 프로에 데뷔한 후 현역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십수년이다. 도전, 또 도전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뛸 수 있는 구단으로 둥지를 옮겨야 한다. 해외에서 의미없는 방황은 한국 축구에도 큰 손실이다.
슈틸리케 감독의 경우 더 이상 실험할 시간이 없다.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기존 자원들로 벽에 부딪히면 전술 변화를 통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고집보다는 상황대처 능력이 우선이다.
팬들의 전폭적인 응원도 필요하다. 개울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함성과 힘이 소중할 때다.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가는 숨을 쉬고 있는 한국 축구가 다시 호흡할 수 있는 산소통이다.
2017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월드컵과 한국 축구의 운명이 동시에 시위를 떠났다. 요행은 없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도를 걸으며 후회없이 뛰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스포츠 2팀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