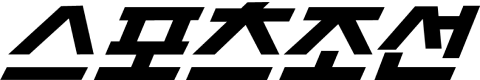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우리도 이제 어른이잖아." 운전을 하다가, 술을 마시다가, 문득 이래도 되나 싶어 움찔하는 스무살에게 '어른'이란 말은 묘한 안도감을 준다. 그래, 우리도 어른이니까. 뭐든 괜찮을 거야.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호소해도 경찰은 물론 부모들마저 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부모들은 "당신네 아이가 순진한 우리 아이를 꾀어냈다"면서 서로를 탓하느라 바쁘고, 경찰은 윗선으로 걸려온 전화 한통에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말한다. "세상엔 친구보다 지킬 게 더 많다"고, 그러니 진실 규명보다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어른이 돼 봐. 어른들이 하는 말 이해하게 될 거야." 미숙한 스무살은 아직 어른이 아니었던 거다. 네 친구는 격렬한 저항 끝에 굴복한다. 어쩌면 그들이 어른을 자처했던 건, 미숙함에서 오는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영화 '글로리데이'는 어른이란 존재의 뻔뻔하고 비겁한 민낯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청춘의 오늘을 얘기한다. 스무살 문턱을 넘어선 이들이 처음 마주치는 건,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닌 현실 사회의 부조리다. 힘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값을 치러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선 남을 짓밟아야 하는 비정한 세상. 희망보다 절망에 익숙해진 청춘은 성장하지 못하고 생존에 매달린다. 영화 속 네 친구들의 얘기인 동시에 이 시대 모든 청춘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영화 속 스무살에게, 이 시대 청춘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영화에 그려진 부모들의 해법과 공권력의 행태는 새삼스럽지도 않을 만큼 익숙해서 뭐라 비난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죄책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극장문을 나선 뒤에도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다. 반짝이던 청춘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저릿하게 그려낸 주연배우 지수, 김준면(엑소 수호), 류준열, 김희찬의 열연도 한 가지 이유다.
영화에서 모든 책임은 결국 약자에게 떠넘겨진다. 스무살은 그렇게 세상의 가혹한 질서를 내면화한다. 청춘의 성장통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글로리데이'는 성장영화도, 청춘영화도 아니다. 청춘의 오늘을 구겨버린 어른과 사회의 책임을 묻는 영화다.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