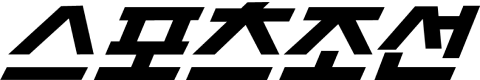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지난해 한화 투수 권 혁에겐 '혹사'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녔다. 본인은 문제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김성근 한화 감독은 권 혁과 박정진만 '편식'했다며 비난에 직면했다. 김 감독의 쌍방울, SK 시절 단명한 선수들까지 언급됐다. 10개 구단 중 훈련량이 제일 많은 한화. 김성근 감독과 혹사는 일면 개연성이 있어 보였다.
이번엔 한화와 훈련스타일에 있어 대척점에 있는 넥센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한현희의 팔꿈치 수술 시즌 이탈에 이어 기대주 투수 조상우(22)가 최근 오키나와 캠프에서 팔꿈치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다. 시즌을 통째로 접어야할 상황이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조상우가 다소 무리를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염 감독은 자율훈련 신봉자로 김성근 감독과는 지도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메이저리그와 일본야구의 혼재
야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투수 몸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일본 투수들은 여전히 메이저리그보다 많이 던지지만 자신들만의 이론이 있다. 6인 선발로테이션에 따른 불가피한 한계 투구수 증가, 투수들의 하체강화와 어깨근육 단련법은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많은 에이스들이 잇달아 팔꿈치와 어깨수술을 했다. 조로현상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아직은 변화 움직임이 크지 않다. 일본야구협회의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투구수와 부상위험 상관관계 연구 등은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메이저리그는 수십년전부터 좀더 체계적으로 투구수를 관리한다.
국내야구는 메이저리그식과 일본식이 혼재돼 있다. 혹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차를 무시한 획일적 잣대와 성급한 일반화 오류 때문이다.
조상우는 지난 2년간 불펜에서 뛰었다. 2014년 48경기서 69⅓이닝, 지난해엔 70경기에서 93⅓이닝을 던졌다. 포스트시즌과 프리미어12에서도 피칭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많이 던져 다쳤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권혁은 지난해 78경기에서 112이닝을 던졌고, 박정진은 76경기에서 96이닝을 소화했다. 둘은 올시즌에도 한화의 주축 불펜 멤버다. 어린 선수여서 부상 위험이 높았다는 것도 근거 없다. 나이가 많고 연차가 높으면 부상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누구는 이랬어'가 선수 잡는다
'전설의 두 에이스' 선동열 전 감독과 고 최동원 전 감독은 다른 길을 걸었다. 1986년 23세였던 선동열 전 감독(당시 해태)은 262이닝을 던졌다. 그해 28세였던 고 최동원 전 감독(당시 롯데)은 267이닝을 던졌다. 지금같으면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최동원은 1983년 208⅔이닝, 84년 284⅔이닝, 1985년 225이닝, 1987년에도 224이닝을 던졌다. 이후 1988년부터 부상 등으로 100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최동원은 1990년 삼성에서 은퇴했다. 선동열 전 감독은 어깨 건초염 재활을 한 1992년(11경기 32⅔이닝)을 제외하곤 은퇴할때까지 부상이 거의 없었다.
예전엔 던질수만 있으면 마운드에 올라 볼을 뿌렸고, 그래서 다치면 할 수 없던 시절이다. 최동원 전 감독의 혹사논란도 1984년 한국시리즈(5경기 4완투, 1완봉, 4승(1구원승)1패, 40이닝) 때문에 전국민에게 부각됐다.
둘의 다른 야구인생에 대한 원인 분석도 의견이 분분하다. 둘다 많이 던졌지만 최동원의 경우 '너무 많이 던졌다' 정도로 설명될 뿐이다. 선동열 전 감독의 투구폼이 부드러워 부상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이다. 선동열의 몸이 아니면 선동열 폼으로 던지는 것도 쉽지 않다.
일본에서 뛰다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복귀한 구로다 히로키(42, 히로시마)와 마쓰자카(37, 소프트뱅크)는 둘다 일본에서 '고무팔'이란 소리를 들었다. 구로다와 마쓰자카는 메이저리그의 불펜피칭 투구수 제한에 불만이 많았다. 특히 마쓰자카는 이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둘의 몸상태는 차이가 있다. 구로다는 올해도 건강하게 마운드에 서고, 마쓰자카는 지난해 어깨수술 뒤 올해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다. 야구와 마찬가지다.
선수-벤치간 소통이 부상위험 줄인다
선동열을 떠올리며 아무에게나 스프링캠프 불펜피칭 3000개를 권유하는 것은 큰 무리수다. 피칭을 통한 어깨단련이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좀더 면밀히 지켜볼 수 있는 혜안과 여유다. 또 선수가 자신의 몸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엄격한 선후배 문화가 KBO리그에 뿌리박혀 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크다. 선수와 벤치의 건강한 소통은 선수 몸을 지키는 초석이 된다.
조상우의 경우 고교시절부터 오른팔꿈치 인대 부상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인대와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근원이다. 요주의 선수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해서 부상을 온전히 막을 순 없지만 현 상황에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선수는 던져야 성적을 내고, 성적을 내야 연봉이 올라간다. 감독의 존재 이유 또한 팀 성적이다. 어찌보면 열정으로 포장되는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좀 더'에 대한 열망은 당연하겠지만 과욕은 전부를 잃을 수 있다. 명장과 레전드는 이 끝없는 욕심 속 '절제'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