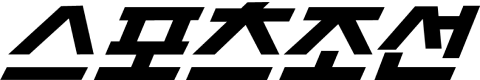|
|
김성근, 김경문 전 감독. 2000년대 말 SK와 두산을 강팀으로 이끌며 프로야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령탑이다.
숨막히는 라이벌 승부를 펼쳤던 두 명장이 공교롭게 같은 시즌 퇴진했다. 이유는 전혀 달랐지만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만들어낸 팀을 제 발로 떠났다.
'임기 보장' 없는 최고 권력자
프로야구단에서 감독은 현장의 대통령이다. 마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처럼 모든 권력은 감독에게 집중돼 있다. 감독의 결정은 곧 선수단 사이에 법으로 통한다. 막강한 권력만큼 결정 권한도 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책임도 크다. 최후의 결정권자인 감독은 그래서 외롭다.
하지만 감독의 파워가 다 같은건 아니다. 팀 내에서 감독의 위치와 능력에 따라 강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감독이라도 남은 임기에 따라 달라진다. 두산 김경문 감독은 "감독으로 선수단을 통솔하다보니 1년차 때와 2년차, 3년차가 모두 다르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감독 부임 첫해는 보통 가장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다. 계약 마지막 해는 상황에 따라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다. 연임 가능성이 적을수록 감독의 장악력은 급속도로 떨어진다. 장기적 시각으로 팀의 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팀이 신임 감독에게 파격적인 장기 계약을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행 체제의 한계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데서 나온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제한적이다. '대행을 떼고 감독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선수단에 퍼지는 순간 감독 대행은 힘을 잃는다. 설상가상으로 내부 인물이 '감독 야심'을 현실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팀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보장'이 없는 한 자칫 허수아비 사령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위치가 바로 감독 대행이다.
'꼬리표 떼기', 조바심과 욕심의 함정
대부분의 '감독 대행'은 위기 속에 갑작스럽게 선임된다.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거나 경질될 경우 수석코치가 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위권을 달리던 SK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바통을 물려받는 대행은 취임 직후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수습'에 주력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코치와 선수들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 대행 체제 초기, 선수단은 위기의식과 동시에 변화 속 기대감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통상 대행 체제 초기에 반짝 성적이 나는 이유다.
변화 이후 예상 밖 선전이 이어지면 팀 안팎의 주목이 쏟아진다. 큰 욕심 없던 감독 대행조차 슬금슬금 야망이 생기는 시기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조바심도 생긴다. 선수와 코치들을 닥달을 하기도 한다. 감독 대행의 '변화'에 반발이 생긴다. '대행 꼬리표 떼고 진짜 감독이 되려고 저런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한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긴 어렵다. 일부 사령탑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시대가 가고 '소통의 리더십' 시대가 오고 있다.
초보 감독임에도 첫 시즌부터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삼성 류중일 감독이 대표적이다. 2006년 6월6일부터 LG 감독 대행으로 당해 시즌을 마쳤던 롯데 양승호 감독은 당시 경험을 설명하면서 "대행 체제로 좋은 성적을 올리기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