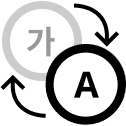|
|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K리그 경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과감해지면서 현장 지도자들의 곡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벌써 K리그1 4개팀의 감독이 물러났다. 지난 4월 12일 전북이 단 페트레스쿠 감독과 갈라선 후 같은 달 25일 최원권 대구 감독, 5월 22일 이민성 대전하나 감독, 7월 8일 조성환 인천 감독이 잇달아 구단과 작별했다. 공교롭게 하위권에 처진 9~12위팀이 코치진에 변화를 줬다. 성적을 반등하기 위한 카드로 '감독 교체'를 빼든 것이다. 전북은 김두현, 대구는 박창현, 대전은 황선홍 감독에게 '소방수' 역할을 맡겼다. 인천은 차기 사령탑을 외국인 위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시즌, K리그1는 역대 최다인 6명의 감독이 시즌 중 물러났다. 수원 이병근, 전북 김상식, 강원 최용수, 서울 안익수, 수원 김병수, 제주 남기일 감독이다. 올해 감독 교체 속도를 보면 단일 시즌 최다 감독 교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홍명보 감독이 A대표팀을 맡기 위해 떠나면 벌써 7월까지 5명의 감독이 바뀐다. K리그2까지 합칠 때 8명이다. 앞서 성남 이기형, 수원 염기훈, 부산 박진섭 감독이 물러났다. 물러난 사유는 K리그1과 K리그2 지도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둘 동료 지도자가 지휘봉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본 복수의 감독들은 극심한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비단 강등권에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만두는 감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프로 경험이 있는 한 국내 지도자는 "시즌 초엔 새롭게 준비한 전술 전략, 뉴 페이스를 투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지만, 최근엔 개막을 하자마자 잔류 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라며 "시즌 초부터 승점에 급급해 라인을 내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감독을 흔히 '파리목숨'이라고들 하는데, 요새 지도자들은 파리목숨보다 짧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