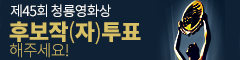|
"정말 옷 벗으려고 했다."
올 시즌 유난히 시련이 많았다. 시즌 초반 부진했다. '대체포수'로도 나왔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거기에 잔부상이 겹쳤다. 결국 지난 6월24일 2군에 내려갔다. 잔부상을 치료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한계가 눈 앞에 있었다. 문제는 타격폼이었다. 지난해 4대3 트레이드로 LG에서 SK유니폼을 갈아입었을 때부터 김 감독은 "앞으로 쏠리면서 스윙하는 타격폼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는 "그때부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센스가 좋지 않다. 어떤 변화에 적응하려면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최동수는 "몸도 마음도 지쳤었다. 문제점은 아는데 고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한계였다.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난 뒤 유니폼을 벗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말 마지막이었다. "딱 마지막으로 변화를 시도한 뒤 안되면 미련없이 은퇴하려했다"고 했다.
그때 팀 후배 최 정의 변화된 타격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타격 시 몸의 이동중심 자체를 앞에서 뒤로 좀 더 두면서 스윙하는 폼이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최 정의 타격폼을 수천 번 클릭했다"고 했다.
그렇게 안되던 스윙폼이 기적처럼 갖춰지기 시작했다. 최동수는 "너무 신기했다. 2군에서 경기하는데 감독님이 주문한 그 폼으로 타격이 되더라. 확실히 스윙이나 타구의 질이 좋아졌다"고 했다.
최동수의 그런 변화에 김 감독은 곧바로 1군으로 호출했다. 최동수는 "2군에서 좀 더 경기를 하고 싶었다. 바뀐 타격폼을 실전에서 좀 더 익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덜컥 1군에 올리셨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전에서 드디어 최동수는 7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했다. 첫 타석에 안타, 두번째 타석에 2루타를 때려냈다. 그는 "그때 너무 떨었다. 바뀐 타격폼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두번째 타석에 2루타를 치고난 뒤 완전히 감이 왔다"고 했다.
지난 4일부터 그의 타격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7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 타율이 무려 4할7리다. 그의 안타 하나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흔적들이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